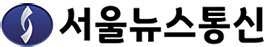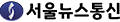딱히 공인 중개사 시험에 관심이 있던 것도 아니고 그저 ‘화살코’ 개그맨 서경석이 ‘갈지자’로 걸으며 날리던 ‘멘트‘인 “공무원시험은 ㅇㄷㅇ, “공인중개사 시험도 ‘ㅇㄷㅇ’”이라고 외치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상기되 한 번 더 훑어본 것이다. 그리고 얼마 전 우리나라 전통을 조리 있게 기술하던 ‘어떤이’가 ‘집주름’에 대해 서술한 부분을 인상 깊게 보았기 때문에 참고하며 ‘겸사겸사’ 이 글을 쓰게 된 것이다.
요즘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 특히 주거나 주상복합 등이 거의 기업이 고용한 ‘분양광고’와 ‘분양대행사’를 통해 매매가 이루어지는 관계로 이직업도 언젠가는 A·I(인공지능)에 밀려 사라질 사양직업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암튼 이런 ‘중개업’에 종사하는 이들을 좋은 말로는 ‘공인중개사’라 하고 우리 귀에 익은 말은 ‘복덕방 아저씨’였다. 옛날 조선시대에도 이 직업이 존재했다고 하며 당시 이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집주름’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사전 적 의미의 ‘집 주름’이란 ‘집’을 사고파는 사람 사이에서 흥정을 붙이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라고 한다. 일종의 ‘브로커(broker)’역할이다.
주거용 집인 주택을 비롯하여 각종 부동산 등을 전문으로 중개하던 ‘가거간(家居間)꾼’들은 조선 중엽부터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었다고 한다.
일제가 한·일 합방을 위해 최고의 극성을 부리 던 1900년대 초에는 부동산 매매 뿐만 아니라 임대차, 전당(典當)분야까지 넓혀갔으며 ‘가쾌’라는 칭호를 썼다고 한다. 당시는 한글을 언문(諺文)이라며 무시하던 때라 ‘집주름’이라는 우리말이 그렇게 보편화 되지 못했던 것 같다.
사회 지도층이던 사대부들이 ‘漢文(한문)‘만을 진서(眞書)라고 주장하던 시절로 ’한양이나 평양‘ 같은 큰 도시에서는 특히 ’가쾌‘라는 호칭을 주로 사용했다고 한다.
조직이 없이 자유롭게 프리랜서(free-lancer)로 활동하던 ‘집주름’ 종사자들이 모여들며 1800년대 말부터 단체를 이루기 시작, 자연히 하나 둘씩 사무실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것이 ‘복덕방(福德房)’의 시초이며 전신이라 할 수 있다.
서양 문물의 유입 등으로 야기된 일상의 발달은 사회생활 전반에 빈번한 왕래를 불러왔고 주거지와 사업소의 이동 또한 과거에 비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던 때라고 한다. 자연히 ‘집주름’을 찾는 수요가 급증했고 전국적으로 ‘집주름’들이 차린 100여개의 중개소가 생겨났고 종사자만도 500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하지만 ‘집주름’들의 기형적인 증가로 거래질서의 문란과 사회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1890년 ‘객주거간규칙(客主居間規則)’이라는 제도가 반포되었고 한성부(漢城府)에 한해 ‘허가제’로 실시되다가 1910년에야 자유화되기도 했다.
‘집주름’이란 직업은 큰 ‘이문’으로 높은 인기가 있었지만 사기성 또한 다분해 부정적 시각이 강했다.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1753년 7월 5일자에 ‘부마도위(駙馬都尉)’후손인 윤성동이 ‘집주름’으로 전락해 일정한 거주지나 직업도 없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온갖 나쁜 짓만 일삼는 자들을 일컫는 ‘무뢰배(無賴輩)’로 표현하고 있다.
‘열하일기’의 저자 박지원(朴趾源)도 ‘권모술수’에 능한 사람을 꼽을 때 ‘집주름’들을 제일 먼저 꼽았을 정도였다, 이는 오늘 날 ‘집주름’ 인 ‘공인중개사’란 직업이 팍팍한 서민들이 ‘호구지책’으로 찾는 직업이 되어가는 현실이 너무 가슴 아프다.
추운 겨울 지하철 입구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던 초로의 중년사내 얼굴에서 우리나라의 팍팍한 경제현실을 보는 것 같다. ‘착잡한’ 하루의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