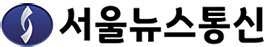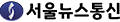바로 마당이 있어 꽃을 심고 나무를 가꿀 수 있다는 점이다. 그들의 마당에 수선화 꽃이 피어났다고 가정해 본다면 그들은 얼마나 행복해 할까 상상을 초월한다.
“우리 집 마당에 수선화 꽃들이 피어나고 있어요.”
내가 잘 아는 분 중에 아침마다 시인들에게 살아가는 이야기를 속삭임처럼 보내 주시는 시인이 계신다. 오늘의 소식에는 카톡에 찍힌 세 송이 수선화의 노란 미소를 보내 오셨다. 어찌 그리 예쁜지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본다. 그 시인은 지난 가을 수선화의 둥근뿌리를 잘 보관하고 겨우내 보살피셨다고 한다. 이른 봄부터 간절하게 꽃피기만 기다리며 얼마나 애지중지 하셨을까 가히 짐작이 간다.
“수선화가 대단히 강한 꽃이어요. 어떻게 추운 겨울을 땅 속에서 지내는지 몰라요. 수선화 뿌리를 벗겨보면 양파처럼 비늘 밖에 없는데 어디서 이런 예쁜 색깔의 꽃이 나오는지 필 때마다 감동이어요”
그런 말을 들으니 문득 내가 좋아하는 정호승 시인의 “수선화에게”란 시가 떠오른다.
울지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공연히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느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네가 물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 “수선화에게” 전문-
시인의 눈길은 어디에 닿든 시어를 캐낸다. 정호승 시인은 왜 수선화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 분명 수선화를 닮은 여느 사람일 텐데 아마도 그 시를 쓰기 전 수선화를 닮은 또 다른 수선화같은 사람에게 시인다운 말을 시로 전하고 싶었을 것이다.
수선화의 유래를 보면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미소년 나르시스(나르키소스)가 제 모습에 반하여 죽어 꽃이 되었다고 한다.
꽃 모양은 은 접시에 금잔이 놓여있는 듯 아름답고 향기도 강하다고 했다. 감탄이 절로 난다. 어쩌면 그리도 실감나게 수선화를 표현했을까. 언어의 표현은 참으로 놀랍다는 생각이다.
서양 사람들의 수선화에 대한 가르침의 비유는 아주 인상적이다.
"두 조각의 빵이 있는 자는 그 한 조각을 수선화와 맞바꿔라. 빵은 몸에 필요하나, 수선화는 마음에 필요하다."
수선화를 바라보며 마음 둘 무엇인가를 찾는 것은 자기 자신을 놓으라는 말과도 비슷하다. 공연히 숙연해지는 그 말은 현재에 사는 도시인들에게는 아주 필요한 암시적 교훈이다.
그런데 옛 시인의 시 수선화에도 눈길이 간다.
한 점 찬 마음처럼 늘어진 둥근 꽃/ 그윽하고 담담한 기품은 냉철하고 준수하구나매화가 고상하다지만 뜰을 벗어나지 못하는데/ 맑은 물에서 진실로 해탈한 신선을 보는구나 - 김정희 〈수선화〉 -
위 시의 마지막 행처럼 추사 김정희선생은 길가에 야생화처럼 피는 수선화에서 해탈한 신선을 보셨다. 그러하기에 봄꽃이 피기 전 노란 웃음을 머금고 지나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닌가.
놀랍도록 청초함을 가히 해탈에 가깝다고 보셨으니 아마도 생각의 생각 중에 채취한 시어이셨을 것임에 틀림없다. 이런 아름다운 수선화를 올 봄에는 좀 더 가까이 나만의 시와 함께 가까이 두고 접해보면 어떠하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