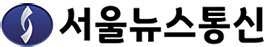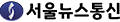세월이 지나가는 길목에는 유난히 마지막을 두껍게 채색하는 12월의 중반이 들어 있다.
씁쓸하기도 하고 차가워 보이기도 하는 12월은 우리에게 내려놓음의 암시를 은연중에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올 한 해는 보이지 않는 하늘을 바라보며 별들을 생각하고 별들에 대해서만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을 해댔던 것 같다. 너무 멀어서 잡을 수 없는 별들을 왜 무시로 생각하고 따라가 보려 했는지 스스로도 모르겠으나 자꾸만 별들의 손을 잡고 싶고 만지고 싶어 한 숨을 쉴 때가 종종 있었다. 어쩌면 거꾸로 그 별들이 가깝다는 착각이 들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그 별들을 손쉽게 잡을 수 있다는 엉뚱한 자신감과 어딘가로 무수히 내 닫는 별들의 욕망을 알아내고 싶은 두 가지의 마음은 늘 내 안에 도사리고 시시탐탐 애간장을 닳게 했다. 그렇게 한 해가 지나가는 마지막인 요즈음은 사실 내 안의 별들은 사라지고 그들이 보여 주었던 애잔한 불빛만 어슴푸레하게 남아있다. 살아가는 것에 대한 회의는 나락으로 빠져 들어가는 마약같은 것을 투입한다. 내면의 탄탄한 아성은 간 곳 없고 허술하고 빈 쭉정이인 거푸집만 이리 날리고 저리 날리는 환상 속에 빠져 허우적대고 갈 길을 잃은 철새처럼 회오리 바람을 탄다.
일상은 갈등 속에서 담금질로 연마하며 버티는 다람쥐 쳇바퀴의 연속이 맞는 것 같다. 수 없는 자아의 자포자기를 경험하며 위태로운 경계선을 드나드는 것, 동시에 저울질 하면서 자맥질은 하는 마음은 뒤집어 보면 허술하고 나약한 실체이기도 하다. 한 해가 아니고 쭈욱 그래 왔을지도 모르는데 스스로를 새김질하거나 다시 점검할 새가 없었던지 아니면 그 작은 아집 조차도 엎어 버렸던지 선명하지 않다. 봄부터 가을까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어둔 골목길을 지나는 일을 습관처럼 해 왔다. 아마도 야심한 밤이라고 하는 게 맞는데 그렇게 골목길을 돌아 집으로 갈 때면 어김없이 모서리 가게에서 나오는 유령 같은 아기별들이 종종걸음으로 어디론가 내닫는 것이 보였다. 무리지어 가는 그 애들은 한 방향으로 쉼 없이 돌진했으며 누가 보든 말든 정해진 목표를 위해 신나게 달리고 있었다. 그건 살아있는 별이 아니고 누군가 만들어 놓은 인위적인 네온별이었는데 그 별들을 보면서 실제로 잡으려 했던 별들을 보는 느낌은 바로 설레임이었다. 어찌 보면 내 딸의 아이 같기도 하고 아들의 아이 같기도 한 그 별들을 한참이나 멈춰 서서 바라보며 수 없이 중얼거리는 것은 “그래 잘 있지? 반가워, 사랑해”라는 것이었다. 오늘 또다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은 예기치 않았던 겨울비로 인해 그 아기별들의 무리를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잘 있느냐고 물을 수도, 사랑한다고 말할 수도 없고 무심한 겨울비의 느닷없음에 작은 희망마저 흘려버린 것이 이 겨울에 너무도 참담하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겨울은 그렇게 서서히 우리 곁에 다가온다. 겨울치고는 때늦은 감이 있으나 한두 번 추절추절 겨울비가 내리고 그 뒤를 이어 한파가 몰려온다. 이번에도 그렇다. 얼마 전 내렸던 겨울비는 양도 많고 기온도 포근해서 겨울이라고 잔뜩 긴장했던 마음을 살포시 건너가 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무방비로 며칠은 잘 지냈다. 일기예보로 보면 분명히 비 오는 것이 많은데 마음으로 괜스레 일축해 버리고 추위 따위는 아무 것도 아니라는 듯 속으로 너스레를 떨었다. 어쩌면 이 겨울에도 별들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다른 상황은 개의치 않았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또 다른 작업으로 다시금 눌러 앉은 시간 겨울의 밤은 시린 12월을 안고 무섭게 마음을 얼어붙게 하고 있다. 별을 사랑하는 사람들, 별을 노래하는 사람들, 별을 무한히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겨울에 어디 어느 곳에서 별들을 바라기할까.
차라리 모조품 아기별들의 줄달음을 바라보며 위안을 삼는 것이 더 안정 되는 건 아닐지.
“그래, 안녕? 잘 지냈지? 올 한해도. 널 만나서 반가웠어. 이제 아무 것도 바라지 않아. 어디로 가느냐고 묻지도 않겠어.”
“겨울 한파 속에서도 나는 너희들의 나라로 함께 갈 거야. 지난 가을 내 아비가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며 별 하나를 하늘에 띠울 때처럼 그저 담담하게. 언젠가는 나도 아비를 따라 별 하나를 띠우며 너희들과 작별할 거라는 것도 말하지 않겠어.”이제 깊어가는 겨울 한 해의 모서리도 조금씩 사라져 갈 것이다. 언젠가는 우리들의 한 켠에서 자라나는 새로운 새싹들 꿈을 꾸면서. 자, 이제 가는 거야.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겨울의 깊은 강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