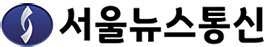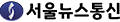오늘 밤도 바다에서 몸을 씻고 올라온 달님이 향긋한 머릿결로 산허리를 휘감고 잿빛 바위에 앉아 있습니다. 떡갈나무 숲 작은 바위 아래 고라니 남매가 잠을 자는 얼굴을 조용히 들여다봅니다. 낮 동안 내린 가을비로 초록빛 진한 풀내음에 달님은 얼굴을 가져다 대봅니다.
반딧불이가 긴 동그라미를 그리며 잿빛 바위를 날아다닙니다. 돌돌돌 계곡의 물소리가 소나무 숲에서 우~~ 소리를 내며 부는 바람소리랑 어우러집니다.
달님은 눈을 감고 조용한 행복에 잠겨듭니다.
산자락 호숫가 풀숲에서 달맞이꽃이 가슴을 두근거립니다. 처음 가슴을 두근거린 날 언제였는지 까마득 오래인데, 달님을 향한 달맞이꽃의 두근거림은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언제나 금방 목욕을 끝낸 것처럼 해맑은 얼굴에 보일락 말락 하얀 그리움을 담은 미소로 말없이 산마루에 걸터앉아 밤새 숲을 보듬는 달님의 아늑한 가슴, 모두가 잠이 든 숲, 산이 만들어내는 보드라운 선율에 달님은 살포시 눈을 감고 하얀 그리움으로 행복해합니다. 누군가 서러움으로 울며 달님을 바라보면 그 사람 눈물방울 하나하나 금빛 조각으로 반짝이게 하며 눈물짓는 아프디 아픈 가슴으로 달님도 함께 웁니다.
달맞이꽃은 오늘 밤도 설레임 가득한 노란 가슴에 하얀 달빛을 담으며 달님을 향해 핍니다. 달님이 너무 좋아 달님 외에는 아무에게도 그 예쁜 웃음을 보이고 싶지 않아 밤에만 몰래 달님을 향해 핍니다.
어릴 적, 마을 앞을 흐르는 냇가의 조용한 외딴집 뒤뜰에 달맞이꽃 하나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뒷마당에 멍석을 펼치고 저녁을 먹은 후면 동생들이 여느 때처럼 동네로 올라가 오늘 낮에 다 못한 구슬치기, 딱지치기, 숨바꼭질로 신이 나는 시간, 어머니와 나는 아버지가 피워놓은 모깃불 옆에 함께 누워 밤하늘의 별들을 보곤 했습니다. 전깃불이 들어오지 않는 시골이라 밤하늘은 주먹만큼이나 큰 별들로 가득했습니다.
여덟 번째 생일이 지난 그해 여름 밤, 멍석에 누워 별을 보고 있는 내 손을 어머니가 살며시 잡아끌었습니다. 영문을 모른 채 일어나 어머니의 손끝이 가리키는 곳을 따라 눈길을 돌렸습니다. 아~! 순간 너무 놀라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달맞이꽃의 노랗게 큰 꽃망울 하나가 우리 눈앞에서 파르르 떨더니 꽃잎들이 스르르 퍽! 퍽! 하며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였습니다. 어머니는 커다란 눈으로 깜짝 놀라고 있는 내 등을 한 손으로 가만가만 어루만지시며 다른 손으로 또 다른 꽃망울을 가리켰습니다. 또 다른 가지 끝 샛노란 꽃망울 하나가 부풀어 오르는 듯싶더니 금세 또 ‘사르르~ 퍽!’ 하고 꽃송이를 펼쳤습니다. 그 날 이후 나는 어머니와 함께 매일 밤 그 환희의 순간을 기다리며 달맞이꽃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있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내게 달님이었습니다.
대학에 갓 입학했을 때였습니다. 집에서 기차역까지 1시간을 꼬박 걸은 후 기차로 40분을 가서 다시 20분이나 걸어야하는 먼 등굣길을 지각하지 않으려면 시계가 꼭 필요했습니다. 고맙게도 형이 선뜻 자기가 차던 시계를 벗어 내 손목에 채워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그만 그 시계를 잃어버렸습니다. 강의실에 들어가기 전 수돗가에 시계를 잠시 풀어놓고 손을 씻었는데, 깜박 잊었다가 나중에서야 알고 부리나케 달려갔지만 시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늘나라로 가신 후 집안 형편이 몹시 어려워졌던 때라 차마 어머니에게 말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시면 걱정하실까봐 몰래 숨기고 얼마간을 지냈습니다. 며칠 후가 지난 늦은 밤 학교에서 돌아온 내게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아들, 내일 학교 끝나고 기차타고 역에 내리면 몇 시쯤 될까?” “엄마, 왜?” 몇 번을 여쭈어도 아무 말 없이 웃으시면서 내일 역 광장 시계탑 아래서 날 꼭 만나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다음 날 저녁 기차에서 내리니 저만치 어머니가 이미 시계탑 아래 서계셨습니다. ‘1시간도 넘게 걸리는 이 먼 길을 어머니는 왜 걸어오셨을까?’ 나를 향해 활짝 웃으시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왜 내가 저리도 늘 좋으실까?” 나도 웃으며 어머니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천천히 오지, 왜 그리 뛰어? 넘어지면 어쩌려고......” 도무지 까닭을 몰라 하는 내 손을 잡고 어머니는 그렇게 한참을 걸으셨습니다. “엄마. 정말 무슨 일이야?” “응, 조금만 가면 돼.” 그렇게 10분 쯤 걸었을까, 어머니는 문득 커다란 시계점 앞에서 걸음을 멈추시며 나를 보고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그래, 어머니는 내가 시계를 잃어버린 줄을 이미 알고 계셨어.’ 그제야 눈치를 챈 내가 깜짝 놀라 어머니에게서 손을 뺀 후 머뭇거리고 있는데, 어머니는 이미 시계점 문을 열고 들어가 손짓으로 빨리 들어오라고 재촉하셨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 시계점을 운영하시는 분이 이웃 교회 장로님이시라서 어머니가 평소 잘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어머니가 품에서 쌍으로 된 금가락지를 꺼내 장로님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날더러 마음에 드는 시계를 고르라 하셨습니다. 난 너무 당황스러워 어쩔 줄 몰라 하다 나도 모르게 그만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 금가락지는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어머니에게 사주셨던 반지였습니다. 아버지 생각이 날 때 마다 꺼내어 자식들 몰래 들여다보고 만지시던 가난한 어머니에게 오직 하나 뿐인 금반지였습니다. 난 펄쩍 뛰며 싫다고 했습니다. 장로님도 가락지를 보시자마자 소천하신 아버지께서 오래 전 사 가셨던 반지라는 걸 금세 아시고 놀라시며 어머니를 말리셨지만 어머니는 막무가내셨습니다. 장로님은 그날 어머니 반지 대신 외상으로 내게 시계를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마도 그 날, 내가 너무 마음 아파할까봐 외상으로 사신 척 한 후, 결국 나 모르게 그 금반지를 도로 가져다 주셨을 겁니다. 그 후 난 어머니 손가락에서 그 가락지를 본 적이 없거든요.
크고 둥근 오늘 보름밤도 달맞이꽃 어머니 품처럼 달콤한 향이 나를 보듬어줍니다. 달맞이꽃 숲에 서서 달님 얼굴에 어머니를 그립니다. 어머니의 고운 미소가 달님의 하얀 미소와 어우러지며 나를 바라봅니다. 조용히 어머니를 부릅니다. 달빛이 너무 시려 그만 눈물이 납니다.

약력
2011년 들꽃 인성 교실 운영으로 <한국사도대상>수상
2014년 아동문예 문학상 수상. 시집-가막살나무, 시가 있는 수필집-들꽃 숲에서 쓰는 편지
수원문인협회 회원, 한국아동문예작가회 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