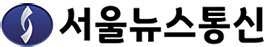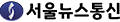내가 살던 고향은 온천으로 유명한 수안보에서 가까운 신풍리란 이름의 작은 마을이다. 그곳에서 태어나 4살까지 살았고 그 후 부모님을 따라 청주란 곳으로 이사를 했다.
성장해서 그곳을 지나갈 때면 내 머릿속엔 하얀 자갈길이 환하게 보이고 달빛이 유난히 밝았던 어느 날만 뚜렷하게 떠오른다. 마치 앞으로 내가 살아갈 시간 들에 대한 무언의 암시를 주는 느낌이 들어 나에겐 고향마저도 신비한 배경으로 남아 있다, 남들은 고향에서 자연스러운 일들을 경험하고 자연 속에서 뒹굴며 부모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너무 어렸을 적 일이라 그런지 도저히 생각이 나지 않는다. 어려서 담을 것이 없는 무채색의 상상 속 고향만 떠오른다.
그런데 여행을 갈 때면 여행지에서 수시로 고향에 대한 갈증을 느낀다. 남들처럼 고향에서 겪지 못한 일들을 그곳에서 찾게 되는 것처럼 여행지 속의 오래된 모습을 보며 고향을 떠올리는 것이다.
이번 여행에서도 그랬었다.
올해 새봄이 온다고 들뜬 소꿉친구들이 무작정 기차를 타고 내려간 곳은 목포란 곳이었다. 난생처음으로 하룻밤을 목포에서 자고 이튿날 목포 투어에 들어갔다. 다른 도시와는 다르게 옛날 모습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 간듯한 풍광들이 남다른 감상에 젖게 했다. 오래된 성당과 일본식 건물, 시가지를 돌아 시화 골목에 들어가 여기저기를 살피는데 소나무에 약간 가려진 안내판이 보인다. 1987 영화촬영지, 목포 연희네 슈퍼 가는 곳을 표시하고 있다. 가파른 골목길을 숨이 차게 올라가니 연희네 슈퍼가 눈에 뜨인다. 관광객들은 작은 슈퍼에 들어가 옛날 추억을 상기한다면서 먹을 것을 사들고 나온다.
우리 모임에서도 한 친구가 가게에 들러 쫀드기를 봉지에 넣어 사 들고 나온다. 현대식인지 쫀드기가 길지 않고 5센티가량 잘라 사탕껍질 같은 포장에 담겨 있다. 한 개를 꺼내 먹어보니 맛이 보드랍고 쫀득해서 먹기가 좋다. 옛날에 먹어보지 못한 쫀드기를 이곳에서 먹어보다니 신기한 느낌이 든다. 어릴 때 쫀드기 한 번 안 먹어 본 사람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하면 내가 손을 들 것이다. 정말 쫀드기는커녕 달고나 한번 해 먹은 적 없었다. 대학을 졸업하고서야 장난과 호기심으로 어릴 적 친구들이 먹는 구경을 했던 기억을 거슬러 올라갔다. 구경만 했던 생각이 나서 달고나 재료를 사다가 집에서 해 먹은 적이 있었다. 그렇게 해 보니 아무런 느낌도 맛도 느낄 수 없었다. 지나간 것은 그냥 추억일 뿐이라는 것을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그렇게 맛있어 보이는 것이 아무 맛이 없다니.
시화골목을 돌아보며 그냥 들어서 알고 있는 서울의 판자촌 생각이 났다. 게딱지처럼 다닥다닥 붙은 낮고 볼품없는 집들의 담벼락에 시화 판넬들이 비 맞은 강아지처럼 축축한 모습으로 붙어 있었다. 읽혀지지도 않고 읽고 싶지도 않을 만큼 가난하게 붙어 있지만 시화 자체가 무언의 숨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 아린 마음이 다 들었다. 알 수 없는 하소연이라고나 할까. 그중 눈에 띄는 김선태 시인의 「조금새끼」 시는 가난한 목포 선원들의 이야기를 풀어 쓴 것인데 괜스레 목젖이 내려앉는 울먹거림이 있다. 그 시화 판넬 뒤로 거칠게 말라버린 가느다란 나뭇가지가 고개를 쭈욱 내밀고 오가는 사람들을 살피고 있다. 그 옆에 「온근동의 숨은 그림찾기」란 시에서는 좁은 골목길 계단을 아코디언처럼 늘어났다 줄어든다며 고난의 길을 암시하고 있었다. 또, ‘흔들리는 전깃줄이 실뜨기를 하는 바람’이나 ‘웅크린 무릎 사이로 빠져나간 한숨을 당신은 찾았느냐고’ 반문하기도 하는 시에서도 힘든 삶의 여정을 대변하는 것 같아 숨이 막혔다.
목포는 나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데 나는 왜 이런 시를 읽을 때면 가슴이 아파지면서 내 고향생각이 나는 것일까,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 그 하얀 추억을.
또 다른 남의 고향에서, 어쩌다 가 보는 여행지에서 기억할 것도 없고, 가 보고 싶지도 않은 고향을 생각하는지 스스로도 의아스럽다는 것이다.
차라리 맑은 물을 먹는 기분이라고나 할까. 그러나 그 고향에는 얼마 전 돌아가신 아버지의 숨결이 있고, 어머니의 굵은 손마디가 보이고, 그보다 더 먼저 세상을 떠나가신 키 작은 할머니의 목소리와 사랑이 들려온다.
내 고향은 그래서 그저 하염없이 언제나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든다는 것이다. 어머니의 어머니가 살아 계셨고 하얀 두루마기의 외할아버지가 사랑방에서 장기를 두시는 모습과 해소기침으로 고생하시던 할아버지, 목소리 카랑한 할머니와 고모들, 큰아버지 큰어머니가 살아서 언제나 나를 부르고 있다.
“잘살고 있니? 어디 아픈 데는 없고....”
“언제쯤 이곳에는 다녀갈 거냐?”
고향을 생각하면 언제나 들리는 목소리들, 올봄에는 어느 색깔 어떤 표정으로 어떻게 고향의 산과 들을 헤매고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