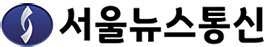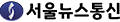시간의 푸른 눈썹이 밤 깊도록 치켜세우며 안간힘을 쓰고 있다. 불면을 불러일으키는 요소 몇 가지가 서서히 발동을 걸고 있다. 밖에는 소리 없이 은행잎이 지는데.
거리를 배회하고 싶은 욕망이 잠들기 전 잃어버렸던 기억을 들추어 내기 시작한다. 슬며시 그가 있던 침대를 훔쳐보다 고개를 떨구고 베개 같지 않은 오목 쿠션에 얼굴을 기댄다. 기침이 쇳소리를 내며 잠시 들려간다. 언제나 그렇듯이 서먹서먹한 느낌의 시간과 낯설음이 못 견딜 만하면 울려대는 반응 그것은 차라리 해소기침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병원이라도 같텐데. 스스로 추측하기에 내 몸에 올라탄 기침은 분명 알레르기의 이부 변종이다.
아무 때나 반응을 하는 데는 명수다. 그것도 잊어버릴 만하면 뭉기적 대며 비비고 들어온다.
신기하게도 첫 방문을 하는 순간 장소의 변화나 공기의 변화를 어쩌면 그렇게도 민감하게 채취하는지 영락없이 쇳소리를 내며 기관지를 긁어댄다. 때로는 헛기침으로 성대가 부풀어 올라 쩔쩔맬 때도 있다. 후두염일까 의심해 보지만 얼마 있다가 사그라진다. 적응하는 시간은 때에 따라 틀리지만 간격이 넓거나 깊이가 같지가 않다. 변덕이라고나 할까. 슬그머니 눈을 감고 엎드리려니 또 잔기침이 훼방을 놓는다. 얼마 전 다인수가 모인 세미나에 갔다가 기침이 나와 캑캑거리고 있는데 주위를 둘러보니 혼자만 그렇게 기침을 하고 있다. “병원에 가야 되지 않겠어요.” 자주 듣게 되는 그 소리가 이제는 차라리 자연스럽다. 어느 시점에서 괘도를 바꾸고 병원엘 가게 될까, 머릿속은 번잡스럽게도 그 시간을 겹치고 있다. 몇 개월? 아니면 몇 주 뒤에? 그러나 한 쪽 마음에선 냉소적이다. 그렇게 시간을 잡아 놓고 가지 못한 일이 비일비재하니까.
컴퓨터 자판기가 원망스럽기까지 않다. 소위 한글 타수가 1급은 될 텐데 한 손가락으로 자판을 두드리며 오탈자를 수없이 생산해 내고 있다. 오목 쿠션 위에 얼굴을 묻고 있었더니 땀이 비 오듯 쏟아지며 숨이 막히기 시작한다. 밤의 초록 눈이 점점 더 영롱하게 독을 품고 있다.
마치 잠을 재우지 않을 기세로 등등하게 초록 뱀들의 거동을 감시하듯이 빙글빙글 돌고 있다.
그 남자는 그날 반 그렇게 슬며시 왔다가 슬며시 가 버렸다. 말은 아주 명료하고 정 스러웠다. 이제 그는 내 것이 아니다. 낮게 깔린 그의 환상은 이미 식어 버린 지 오래고 그는 병마와도 같은 허물어져 버린 일상과 맞짱을 뜨는지 위험수위가 제법 올라와 있다. 분명히 그의 목소리는 며칠 뒤 집으로 들어오겠다는 표현이었는데 그 목소리가 몇 데시벨의 작은 수치로 바뀌어져 내 귓가로 다가오는 순간 아니/ ‘기다리지 마, 오지 않을 거야’ 라고 변형의 혀를 날름거리며 후르륵 도망치고 있었다. “김치 가지고 가” 마치 오랜 생각을 한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말하는 신경 세계가 신기하다고 느껴지는데 벌써 그는 아파트 먼발치로 달려가 버렸다. 분명 들었다. “김치는 안 가지고 갈거야” 그는 속으로 ‘미쳤지, 당신은 미쳤어’라고 하는 것 같았다. 배추밭에서 온 나에게 김치를 가지고 가라니. 그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도 얼마 못가서 오목 쿠숀에 기대어 피시식 웃고 있는 내가 보인다.
그가 그렇게 밖으로 내달은 건 이유가 있다. 침대 위에서 그는 창백했다. 거칠어진 하얀 수염과 깊은 주름의 그는 마치 한 마리 늙은 사자와 같았다. 어찌 보면 힘도 없는 것 같지만 아마도 큰 발톱은 누구보다도 강할 것이리라. 한번 물면 안 떨어지는 하이에나의 기질도 가진 그. 그런 그가 채식주의자로 변하면서 풀을 쑤어 양념을 하고 제법 먹음직스런 김치를 만들어 단톡에 띄운다. 다른 여자들은 그런 남편을 좋아한다던데, 절대로 좋아할 수 없다. 그가 만든 어떤 것도 받아먹을 수가 없다. 차라리 아린 양파즙을 가지고 오면 좋을 텐데, 그보다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더 좋겠지.
그리고 그 주의 마지막 요일쯤 애들은 나 몰래 집 근처를 배회했고, 흔적 없이 무색한 사진 속에서 웃고 있었다. 그런 날의 일정은 마치 어떤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 애들이랑 나를 떨어트려 놓는 장난을 치고 있다는 생각이 심하게 드는 것이다. 아마도 어디 있는지 물어 찾아왔어도 그들을 볼 수 없었을 테니까.
얼마 후 톡에서 그 애들의 모습을 읽어보고 유추해 보니 바로 내가 있는 언저리였음을 실감했다. 마지막 꿈 같은 어쩌면 잃어버린 꿈속에서 나타나는 징크스의 화신처럼 그날은 그랬다. 그가 배추밭에 갔다가 다녀온다고 했던 그런 일들의 퍼즐이었는데 수시로 머리가 아픈 나는 그런 기다림이나 기대보다는 차라리 쉬고 싶다는 생각을 더 많이 했으므로 그 애들과 배추밭 주인인 그 남자가 애 곁에서 나를 걱정하고 있다는 생각은 까마득하게 접어놓았으므로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 못했다.
그 남자 배추밭에서 배추들과 어린 무들과 이빨 성크런 개랑 잘 지내고 있을까....
나는 아직도 사무실에서 무언가 털어내기 위한 작업을 놓지 못하고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