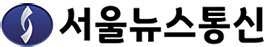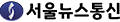새들이 호르륵 까치밥을 물고 가는 채 덜 여문 겨울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입에 묻은 홍시 물을 가지 끝에 닦는 홍새의 앙증스런 몸짓에서 작은 여유를 봅니다.
아듀! 2023년의 작별은 어디서부턴지 가물거리며 와서 서슴없이 멀어집니다.
언제나 달력 한 장 남아 이리저리 흔들리며 천덕꾸러기가 된 날들, 특별하게 올해는 더 애틋하게 가슴에 남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 예정인가요?”
오며 가며 만나는 사람들이 묻습니다. 나는 이대로 있는데 자꾸만 내가 어디로 떠나가는 모양입니다. 사실 몇 년 동안 너무 분주해서 어느 누구하고도 반듯한 눈인사 한번 해 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어리숙하고 변변찮은 나를 확인하기란 더욱 쉽지 않지요. 왜냐하면 그들이 나를 모르는데 난들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쩌다 거울을 보면 낯선 얼굴이 저만치 있습니다. 어느새 초로의 여인은 돌아가신 어머니 같기도 하고 이웃 할머니 같은 모습으로 거울 속에서 저를 신기한 듯 바라봅니다. 철렁거리는 심장을 가다듬고 그녀에게 묻습니다.
“ 당신은 나를 압니까?”
입만 벙긋거리는 모습이 놀라운 듯 두 눈을 커다랗게 뜨고 있는 또 하나의 내가 있습니다.
세월은 그렇게 가나 봅니다. 어느새 여름을 지나 가을로 오더니 기어코 겨울 가까이에서 오들오들 떨고 있습니다. 오늘은 분명히 내 생애의 화양연화라고 당당히 말하는 어느 시인의 모습에서 연민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당당한지 그녀 옆에 있으면 세찬 회오리 바람이 주변을 맴도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 여인이 어느 날 인지장애라고 하며 약을 먹고 있다고 말합니다. 말은 안 했지만 내심 놀란 것이 사실입니다. 총기도 좋고 능력도 좋으며 도전적인 그녀는 어디서나 약방의 감초 같았으니까요. 그런 그녀가 인지장애라니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녀에겐 언제부터인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지요. 그저 바라만 보아도 행복한 기분은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어디든지 그를 데리고 다닙니다. 자랑하고 싶고 소개하고 싶고 무언가 알려 주고 싶어 합니다.
그녀의 나이는 이제 칠순 중반, 용기있는 여인입니다. 그녀의 머리는 윤기가 나고 그녀의 눈빛은 살아서 반짝이는 별이 됩니다. 행동도 민첩해지고 걷는 것도 남다릅니다. 그저 즐겁고 행복합니다. 한번은 봉긋한 가슴을 어루만지며 기분이 좋아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웬일이냐고 물으니 가슴이 너무 예쁘다고 그가 말하더랍니다. 그래서 신이 난다구요. 노년의 사랑은 거침이 없습니다. 부끄러울 것 하나 없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주위 사람들은 그녀를 축복하고 그녀의 사랑에 박수를 보냅니다. 지그시 바라보는 그녀의 남자는 의젓하게 그녀를 돌보아 줍니다. 그녀가 조금이라도 아프면 진심으로 걱정을 해 줍니다. 그게 사랑의 정이라는 것이겠지요. 어느 가수가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불러 대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그 가수가 처음으로 작곡을 해서 가장 가까운 지인에게 가져와 들어보라고 했을 때 지인은 너무 노래가 아름다워 아무도 주지 말라고 하며 찬사를 보냈는데 그는 이미 약속을 했다고 하며 그 노래를 후배 가수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가 대히트를 쳤다니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어요.
가끔 저도 그 노래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사랑은 아프기도 해요. 표현하는대로 그 사람이 받아 주지 않으면 상처를 받지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변하지 않는 다고 누가 말했는데 그것은 사실이 분명합니다. 잔잔하지만 변하지 않는 사랑은 얼마나 멋있는가요?
겨울이 조금씩 다가와서 마지막 남은 낙엽마저 흔들어 버리고 그 위에 천연덕 스럽게 하얀 백설을 뿌립니다. 먹이를 잃은 새들이 이리저리 날아다니며 팔딱입니다. 먹이를 찾기 위한 슬픈 방랑을 하는거지요. 어느 날 집주인이 그 모습을 보고 까치밥을 하나 나뭇가지에 꽂아 놓습니다. 주황빛의 홍시감은 그제야 어느 누구보다 밝게 빛이 납니다. 발갛게 물들은 홍시감의 마음 속까지 알아주는 그 누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날씨가 추운 날, 홍새 부부가 찾아 왔습니다. 새끼에게 먹이를 가져다 주려고 찾다 보니 눈에 띄었나 봅니다. 홍새 부부는 번갈아 찌릇거리며 아기새를 부릅니다. 이윽고 엄마와 아빠를 찾아 온 홍새는 붉게 물든 홍시감을 보고 좋아서 어쩔 줄 모릅니다.
햇볕이 슬그머니 아기새를 덮어 주는 시간에 홍새가족은 나뭇가지에 꽂아 둔 홍시를 조금씩 먹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 모처럼만에 보는 따스한 정경입니다.
세모의 계절,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멀어지고 새로운 누군가를 찾고 있기도 합니다.
이제 또다시 새로운 계절이 오면 누구라도 할 것 없이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상상과 거침없는 무한한 꿈을 꾸고 있겠지요. 하나를 잃으면 다른 하나가 채워지듯이 우리의 삶도 그러하리라 봅니다. 내가 한 잎의 낙엽이면 당신은 이 겨울에 한 잎의 눈송이가 되어 조화를 맞추겠지요.
신비한 자연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하루를 살아가는 거지요.
아듀! 2023년이여.
어제는 힘들고 어려웠더라도 내일은 밝고 환한 만남이 어디선가 쏜살같이 달려 올 것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