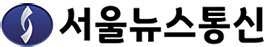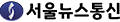강이 함께 흐른다고 했다 그녀의 방에
어둠에 익숙한 그림자 산8번지 축대築臺에 누워있다
바닥까지 내려온 지붕을 열고 그녀가 들어선다
굳게 다문 이빨로
이곳까지 바다를 물고 와 내려놓는다
머리를 세우고 헤엄을 치던 때부터
물살을 갈랐던 등지느러미 꺾고
흐르고 싶은 곳으로 향한다
낮은 창 아래나 축대를 내려와
넓고 깊은 신작로에 이르러 물 밖 세상을 본다
은백색 피부가 가볍지 않다
꽉 다문 입꼬리 실처럼 살랑이고
풀잎처럼 가느다란 몸이 숨탄것이라고
모래 진흙을 헤집어놓는다
무딘 날을 세우며 이빨 자국을 남긴다
물속으로 뛰어 든다
길게 드리운 그림자
차도에 누운 사금파리다
물길에서 인 바람머리를 세우고 밀려든다
페달을 밟는다 등지러미 일으켜 부등깃을 세운다
*풀치: 갈치의 새끼

약력
2002년 지구문학 등단
수원문인협회 편집국장
시집 비처럼 내리고 싶다
남자의 방
시평(詩評)
신경숙 시인의 시를 읽노라면 그녀의 세계는 얼마만큼의 깊이를 가지고 있는지 가늠할 수가 없다. 그만큼 그녀의 시세계를 알고 싶은 욕구가 차오른다. 시가 아주 매료적이다. 때로 그녀의 시를 보면 그녀 자신이 어린 풀치가 되어 있는 것을 본다. 의식 속에서의 끝없는 갈망, 어쩌면 세상에 대한 도전과 상상의 무한성을 그녀는 잘 편집하여 시라는 바늘에 꿰어 강물에 흘러 보내면서 어느새 바다를 물고 온 자신을 발견한다. 시인은 숨탄 몸으로 모래진흙을 헤집어 놓으면서 생명의 존귀함을 생각하고 있는지 모른다. 무딘 날을 세우며 이빨자국도 남기고 살아있음을 확인하러 결국은 물속으로 뛰어들고 만다. 그리고 페달을 밟는다. 부등깃을 세우고 어쩌면 속도를 낸다. 가속도, 그것은 우리들 인생에서 가장 기분 좋고 행복한 질주다. 아마도 그 질주는 궁극적인 그녀의 이상향적 목표 지점을 향하는 어딘가의 파라다이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할 것이다. <수원문인협회 명예회장 정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