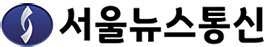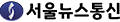예컨대 남유럽 일부 국가에서 예정된 총선 결과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주목된다. 남유럽에서는 재정위기 이후 긴축에 반대하는 좌파 정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 긴축 반대파가 집권하면 유로존과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유럽경제의 갈등 심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세계경제에 미치는 충격파도 증대될 수 있다.
이 같은 대내외 악재에 따른 영향은 구체적 수치로 확인된다. 중국은 지난달 위안화 절하 이후 경기 바닥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중국의 불투명한 시스템은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실물 경제지표를 통해 확인되는 경기 둔화세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월 중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9.7로 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정부 당국의 개입에도 증시 폭락이 멈추지 않자 이제는 중국 공산당의 컨트롤 능력에 대한 회의까지 부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연간 성장률이 5%대로 떨어지며 세계 경제를 침체에 밀어 넣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다.
문제는 한국경제에 미치는 충격파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클 수 있다는 대목이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에 이어 차이나 쇼크까지 이어지면서 우리 경제는 더욱더 벼랑 끝에 선 양상이다.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의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은 25.5%로 미국(13.2%)의 두 배 가까이 된다. 올해 1분기 한국의 대중국 투자액은 16억2000만 달러로 일본, 싱가포르, 대만 등을 앞지르고 있다. 우리 경제에 ‘중국 리스크’가 그만큼 커졌음을 뜻한다. 수출과 내수가 부진한데다 중국의 거품붕괴는 우리 경제에 치명상을 줄 수 있다.
그러지 않아도 지난 2분기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전분기대비)은 0.3%에 그쳤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재정위기에 빠진 유럽의 'PIGS(포르투갈·아일랜드·그리스·스페인)'보다 낮은 이 수치는 우리 경제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 준다. 이런 상황이 지속하면 한국경제가 글로벌 경쟁에서 낙오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우리 경제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외환관리 등 국제금융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