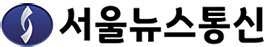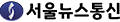“최저임금인상에 따른 구직급여 역전 방지 필요”
우리나라는 1995년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면서 구직급여 상한액을 정액으로 설정하였으나 하한액은 별도로 설정하지 않고 있다가, 1998년 외환위기가 닥치면서 저소득 실직자 지원을 위해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정률의 하한액을 설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구직급여의 상한액은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고, 하한액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상한액은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당시 3만 5천원에서 시작하여 2006년 4만원, 2015년 4만 3천원, 2017년 5만원으로 각각 인상되었으며, 하한액은 1998년에 최저임금의 100분의 70에서 시작하여 2000년에 최저임금의 100분의 90으로 상향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와 같이 구직급여의 상·하한액을 설정하면서 상한액은 정액으로, 하한액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정률로 정하다보니, 고정되어 있는 상한액과 달리 하한액은 매년 인상되는 최저임금액에 연동되어 급여의 상·하한액 차이가 좁혀지다가 결국 상·하한액이 역전되는 현상이 반복하여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상한액이 4만원으로 인상된 2006년 당시 하한액은 22,320원으로 상한액 대비 비율이 55.9%이었으나, 상한액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매년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2008년 67.9%, 2010년 74.0%, 2012년 82.4%, 2014년 93.8%로 좁혀졌고, 이에 상한액을 43,000원으로 다시 인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에는 하한액이 40,176원으로 상한액 대비 비율이 93.4%에 이르러 상·하한액의 차이가 거의 없다시피 되었다.
이러한 추이는 계속되어 2016년에는 하한액이 43,416원이 되어 급기야 상한액을 역전하는 현상이 발생하기에 이르렀고, 이 현상은 하한액이 46,584원으로 상향된 2017년에도 지속되어 결과적으로 2016년부터 상한액이 5만원으로 인상된 2017년 4월 전까지 상한액과 하한액을 모두 동일하게 지급하는 법 위반의 상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2017년 현재 구직급여 상한액 대비 하한액의 비율은 93.2%으로 여전히 상·하한액 간 격차가 거의 없는 실정이며, 더욱이 내년도는 최저임금이 16.4% 인상됨에 따라 하한액이 54,216원이 되어 상한액인 5만원을 다시 역전하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어서 제도개선 없이는 향후에도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삼화 의원은 “구직급여의 하한액을 최저임금 기준의 정률로 정하다 보니 하한액은 매년 인상되는 최저임금액에 연동되어 급여의 상·하한액이 역전되는 현상이 반복하여 발생되는 문제가 있어서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구직급여의 상한액 규정을 법률에서 규정하면 이를 보완할 수 있기에 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조필행 기자
pil3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