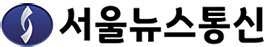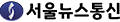뒤꼍 대숲 울타리에서 쪽잠 자던 참새가 후루룩후루룩 기지개를 켠다. 고요하던 아침도 참새들의 재잘거리는 소리에 달콤한 잠에서 깨어난다. 졸린 눈을 감고 참새들의 아침 하모니에 빠져 있노라면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이불을 더 당기고 싶어졌다.
새벽부터 사랑채 무쇠솥에 소죽을 끓이던 아버지가 아직 토광에 들이지 않은 가마니에서 볍씨를 한 웅큼 꺼내 ‘훠이 훠이’ 새들을 부르며 마당에 뿌려준다. 참새들이 우르르 내려와 앉아 짧은 꼬리 흔들어 대며 아침밥을 즐긴다. 때로는 일찍부터 마당에 내려와 식전 공연을 펼치며 재촉하기도 한다. 뿌연 안개가 서서히 걷히고 햇살이 뜨락에 내려앉을 즈음, 참새는 전봇대 전선 줄에 나란히 앉아 있다. 시장 가는 노부부의 사투리 섞인 정담 엿들으며 꾸벅꾸벅 졸기도 하고, 방앗간 벼 찧는 소리가 시작되면 먹이를 찾아 쏟아지는 왕겨 더미 주변으로 날아들곤 한다. 해 질 녘에 대나무 숲으로 다시 모여 밀린 수다를 떨다가 잠이 든다.
하얀 벼꽃이 조롱조롱 달린 벼 이삭이 고개를 내밀고, 매미울음 소리가 서서히 멀어져 가면 여기저기서 참새 쫓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다. 풍년을 기다리는 농부들의 간절한 마음을 아랑곳 하지 않고 배고픈 참새들은 벼꽃을 떨구어 가며 벼에서 우유를 짜 먹기에 바쁘다. 참새가 날아들어 쭉정이가 되기 전에 허수아비를 세워 놓았건만 여전히 날아든다. 하물며 허수아비에 앉아서 졸고 있는 참새도 볼 수 있다. 새들이 덜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알록달록 우산을 펴서 논두렁에 꽂아 두기도 한다. 나도 초등학교 때 몇 번인가 우산을 양산 삼아 쓰고 앉아 새 쫓기를 해본 적이 있다. 우산 아래 앉아 새를 쫓다 보면 목도 아프고, 나른하게 잠이 오기도 했다. 때로는 참새떼가 앉은 줄도 모르고 책을 보다가 잠이 들기도 했다. 꿈속에서도 참새를 쫓는 헛손질을 하다가 논바닥에 굴러떨어져 깨어보니, 서산에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던 적도 있다. 황금물결 따라 말랑말랑해지는 감성의 어지러움을 타고, 개울 따라 산 따라 노닐다 보면 어느새 김춘수 시인의 시 ‘꽃’이 가슴에 피어올랐다. 서늘한 바람이 불고 벼가 영글어가면 허수아비도 참새도 친구가 되어 함께 가을을 누렸다. 지금도 가을 들판을 지나다 보면 무지개 색깔 우산을 쓰고 논두렁에 앉아 책을 읽던 소녀가 거기에 있다.
추수를 마친 어느 날, 아버지가 아궁이에서 낡은 모종삽으로 참나무 장작 숯불을 꺼내어 무쇠 화로에 담았다. 그 후에 일어날 일을 눈치채지 못한 채 언니와 함께 쪼그리고 앉아 화롯불에 언 손을 녹이며 재잘거리고 있었다. 대나무 울타리에서 마당으로 향하는 길목에 쳐진 커다란 그물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여느 날과 다를 바 없었다. 먹이를 찾아 마당으로 오던 참새 중 여러 마리가 그물에 걸려 아등바등하다가 아버지의 손에 잡혔다. 울음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바둥거리는 참새를 움켜쥐고 대문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온 아버지의 손에는 털이 없는 작고 빨간 참새가 앙상한 갈비뼈를 드러낸 채 두 팔을 벌리고 석쇠 위에 누워 있었다. 석쇠는 성난 참나무 숯불에 곧장 올려졌다. 순간 나도 모르게 눈물이 찔끔 났다. 재잘거리던 참새 소리가 낡은 풍금 소리처럼 슬프게 들려왔다. 그런데도 고소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군침이 꿀꺽 넘어갔다. 참새구이가 익어가면 닥나무 껍질 팽이채로 팽이치기 놀이 중인 남동생을 부른다. 비록 어른 엄지손톱보다도 더 작은 새의 다리 고기지만 아들에게 먹이고 싶으셨나 보다. 두 딸의 손에는 살이 거의 없는 새 갈비 한 쪽씩이 쥐어졌다. 한참을 들고만 있다가 호기심에 먹어본 참새 갈비는 약간 비릿한 맛에다 목으로 넘어가는 것은 거의 없었다.
그날 이후 아침에 들려오는 참새들의 소리가 친구들을 부르는 울음소리처럼 들렸다. 잠이 깨면 그물이 또 쳐져 있을까 봐 걱정되었다. 살금살금 일어나 낮은 그물에 걸려 있는 참새의 머리를 빼내 아버지 몰래 날려 보냈다. 그런데 아버지는 우리의 그런 모습을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모른척하고 큰기침만 하셨다. 흰 눈이 내린 날 가끔 그물이 쳐져 있었지만, 참새가 그물에 걸려들기 전에 깡통을 요란하게 흔들어 날려 보냈다. 그 후에도 마당에는 종종 볍씨가 넉넉히 뿌려져 있었다.
참새가 가을에는 농작물을 해치지만 여름에는 해충을 잡아먹는 고마운 텃새이기도 하다. 그때에는 아버지가 우리에게 참새고기를 먹이기 위해 그물을 치신 게 아니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어부가 자식에게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듯, 참새를 잡는 과정을 통해 인생을 살아가는 원리에 대해 가르침을 주고 싶으셨던 것은 아닐까.
아버지는 넉넉하지 않은 살림에도 겨울이 오면 추위에 떨며 굶주린 참새에게 볍씨를 나누어 주셨다.
※ 참새 그물 : 나무와 나무를 그물로 연결해서 참새를 잡았다. (1974년)


약력
문학과 비평 회원
2025년 《문학과 비평》 수필 부문 신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