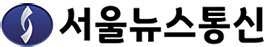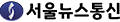【경기·남부 = 서울뉴스통신】 김인종 기자 = 벽제(壁際)는 앞을 쓸어낸다는 말이고 거기에 사람을 뜻하는 ‘꾼’을 붙여 벽제꾼이라고 부른다. 벽제꾼은 벼슬 높은 사람이 행차할 때 위험을 제거하고 위엄을 세우기 위해 큰소리로 외치면서 앞길을 치우는 사람이다. 그러한 일을 하는 벽제꾼을 ‘거덜’이라고도 부른다. 거덜은 재산이나 살림 따위를 완전히 없애거나 결판내어 빈털터리가 된 것을 말한다. ‘거덜’은 원래 조선시대 말을 관리하던 관청인 사복시(司僕寺) 하인을 가리키는 말인데 임금이나 고관의 행차에 거덜이 말고삐를 잡고 앞장서게 된 것이다. 벽제꾼의 행태가 마치 앞길을 완전히 쓸어내듯 거덜을 낸다하여 벽제꾼과 거덜은 같은 말로 쓰였다.
옛날에는 권세가를 등에 업은 벽제꾼 횡포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고, 그러한 기록은 역사서나 문학작품 도처에 보인다. 권세가의 행차 앞을 조금만 늦게 피해도 발로 차고 주먹질하며 밀쳐서 다리가 부러진 사람, 팔이 부러지고 이가 부러진 사람은 물론, 좌판이나 이고 진 물건 등이 망가지기 일쑤였다. 이렇듯 벽제꾼 완장은 위세 등등하여 지체 낮은 백성들의 피해가 심했다.
조선 선조때 재상 이항복(李恒福)이 조정에서 퇴청하는 길에 그의 벽제꾼이 한 여인을 넘어뜨려 다치게 했다. 그날 저녁 이 여인은 대감 집 근처 언덕에 올라 “머리 허연 늙은이가 종들을 풀어 길가는 사람 넘어뜨려 다치게 했다.”라며 “네가 정승이 되어 나라에 한 일이 뭣이기에 이런 위세를 부리느냐?”라고 고함지르며 비난했다. 이항복은 그를 쫓아내지 못하게 종들을 단속하며, “우리집 노복이 먼저 실수했으니 그 여인이 욕하는 것은 당연하다. 저러다가 지치면 돌아갈 것이니 그냥 내버려 두라.”하고 종들을 막았다는 일화는 윤신지가 쓴 파수잡기(破睡雜記)에 전한다.
이름없이 늙은 사내 머리는 빠지고 흰 터럭에 허둥대누나/ 벗들은 승승장구하여 장안 거리 출타마다 앞에는 벽제꾼 뒤로는 호위꾼이라/ 허리 굽힌 내게 이르길 너는 참 어리석구나 공명을 이루려면 일찍이 벼슬을 했어야지/ 머리는 끄덕였으나 마음은 받아들이지 않았네.
위 시는 매월당 김시습이 장안 거리에서 친구의 행차 앞에서 벽제꾼에게 수모를 당한 내용을 읊은 것이다. 비단 벽제꾼은 고관대작만 거느린 것이 아니다. 점차 낮은 벼슬아치들까지도 벽제꾼을 내세우는 바람에 한양 육조거리와 종로거리는 벽제로 붐벼 이를 피해 가는 피맛(避馬)길이 생겨나기까지 하였다. 이런 연유로 생긴 종로 피맛길은 지체 낮은 서민이나 장사치들로 북적거리다 보니 자연히 술집이나 음식점이 들어차게 되었다. 지금은 도심 재개발의 여파로 대부분 없어진 풍경이지만 한때 이곳은 젊은이와 예술인들로 북적거리던 낭만적인 공간이기도 하였다.
조선 시대만 벽제꾼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오늘날 선진화한 세상에서 벽제꾼의 유습은 대통령 행차나 소위 귀빈 행차 등에서도 볼 수 있는 교통통제가 그것이다. 역대 전직 대통령들까지도 전관예우 벽제 행사로 교통통제를 하고 있다. 수년 전 보도되었던 국회 자료에 의하면, 당시 전직 대통령들이 하루 평균 2회꼴로 벽제, 즉 교통통제를 경찰청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식이나 이발 등 사적인 행사는 가급적 삼가 달라는 통보까지 했다는 보도였다.
그런 교통 통제식 벽제 외에도 세상이 바뀌면서 거덜들의 잔습은 돈이 되는 시전이나 산업현장 등으로 유전되어 왈패와 같은 횡포로 나타났다. 지금은 시스템이나 단속 등으로 없어진 풍경이기는 하나, 한때 대표적인 곳이 부둣가 뱃전이나 공사판 등이었다. 고기를 잡아 포구로 귀선하는 배가 부두에 대면 뱃머리에 붙어서서 주변 사람들을 통제하면서 어선에서 던지는 밧줄을 잡아 말뚝에 매고 생선을 사러 온 장사꾼들을 관리하며 부두의 질서를 잡았다. 어부들과 화물 선주들도 이 왈패들과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생각으로 생선을 하역해서 파는 질서나 화물하역과 선적하는 용역을 이들에게 맡겼다. 또 공사판에 일용 노동자를 공급하고 그 이권을 독점하던 노총의 횡포가 최근에는 사회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이런 거덜들의 모습은 시대가 변했어도 양태만 바뀌었을 뿐 벽제꾼의 다른 모습이다.
작금의 나라 경제는 팍팍하고 정치는 시끄럽다. 혹시 정치가 완장 찬 벽제꾼의 행태로 국민 눈에 비치지는 않을지, 공복들은 마음과 매무새를 가다듬고 거울을 들여다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