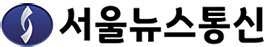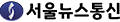수제비를 끓이려고 멸치를 살짝 볶다가 물을 붓는다.
냉동실에 얼려둔 양파 껍질과 파 뿌리를 넣고, 다시마 몇 조각은 마지막에 넣어 육수가 우러나기를 기다린다. 앞이 보이지 않는 빗줄기가 폭포수처럼 쏟아진다. 장마가 시작되나 보다.
얼마 전 어느 연예인은 어릴 적 양철지붕 위로 오동통통 떨어지는 빗소리가 그리워 3도 4촌의 집을 구하면서 바깥 한쪽으로 양철지붕을 만들었다고 한다. 비 오는 날은 그 밑 의자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밤에는 간이침대를 놓아 양철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를 듣고 잠을 청한다며 행복해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 기억의 지문들이 있다. 그것은 감동 받은 음악일 수도 있고, 어느 화가가 그린 회색빛 수채화일 수도 있다. 감탄을 자아내는 느낌과 행복한 감정, 엄마를 떠올리는 그리운 손맛의 음식일 수도 있다. 기억의 어디쯤 도장처럼 찍혀 있다가 마음 시린 어느 날 그 추억이 생각나서 그때 그 장소를 찾아가기도 한다.
그러고 보니 비와 관련된 트라우마 같은 기억이 하나 떠오른다.
여학교 다닐 무렵 우리 가족은 한옥에 살았었다. 주변도 같은 한옥들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하나둘씩 집을 허물고 땅을 돋우어 이층 미니 양옥들이 들어서기 시작하더니 우리 집은 덩그러니 남은 한옥이 되어 버렸다.
비가 내리면 그 동네의 빗물이 한꺼번에 몰려 지대가 낮은 우리 집 하수구는 늘 역류했다. 주먹보다 큰 돌들을 하수구 위에 수북하게 쌓아 놓아 마치 돌무덤 같은 곳에서 거꾸로 빗물이 솟는 광경을 불안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날은 비가 많이 내리는 날이었다. 그런 날은 마당보다 약간 높은 부엌의 나무 문턱을 넘어 연탄아궁이로 물이 흘러 들어갔다. 빗줄기가 잦아들지 않는 밤이면 하수구를 정리하고 화덕으로 옮겨 놓은 연탄불을 지키며 어른들은 대기 상태로 밤을 새우곤 했다. 줄기차게 내리는 빗소리와 두런거리는 소리로 잠을 설치며 다음 날 아침 부스스한 얼굴로 학교를 갔던 기억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다.
하절기에는 학교 다녀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하얀 끈 묶는 운동화를 럭키 치약으로 닦아 부뚜막 가장자리에 세워놓는 일이었다. 백옥같이 닦은 하얀 운동화를 신는 일은 그 당시 내가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멋 부림이었고 자존심이었기에, 비 오는 날 닦지 못한 운동화를 보며 우울함 가득하다며 일기장에 적은 기억도 생각난다.
석유풍로를 사용하던 때는 신혼 초부터였다. 몇 년 후 2구짜리 가스레인지로 교체하며 행복해하던 기억에 슬쩍 미소가 지어진다. 물도 불도 전혀 걱정 없는 아파트로 이사하고부터는 비 올 때마다 잠을 설치며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 것 같은 묵은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작년에 언니와 찾아 나선 옛집 동네를 헤매다 결국 오래된 인쇄소 문을 두드렸고, 주차장이 되어 있는 집터를 만났다. 우다방이라 불리며 만남의 장소였던 우체국도 박물관처럼 남아 있었고, 주위 몇몇 건물도 세월의 시간을 안고 그 자리에 나이테를 남겨 두었다.
세찬 비가 창문을 두드린다. 빗방울 사이로 옛적 우리 집이 보인다. 꽃밭에는 여름마다 손톱에 물들이던 봉숭아꽃이 조롱조롱 피어 있고, 꽃물을 빨던 샐비어 한 무리도 보인다. 하수구는 여전히 불안해 보이고 담장 따라 빙 둘러심은 무화과나무에서 한 바구니씩 따던 달콤한 무화과는 그 일대 재개발로 인해 오래전 베어지고 없어졌으리라.
빗소리 따라 보고 싶은 사람들이 웃고 있는 그리움 가득한 옛 기억의 지문을 회상하다가 오늘, 눈물 한 방울 툭 떨어진다.

<약력>
- 수원여류문학 회원, 수원문인협회 회원, 경기한국수필가협회 회원
- 경기수필 작품상(2023), 경기수필 신인상(2020), 수원여성 백일장 시 부문 장원(2000),
- 수원사랑 백일장 수필 부문 장원(1997), 수원시 주부의 날 기∙예능 경진대회 수필 부문 특별상(1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