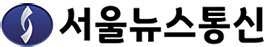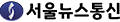【서울 = 서울뉴스통신】 김부삼 기자 =시인 이생진, 그에게선 바다 내음이 난다. 그리움의 향기다. 막걸리 한잔에 취한 그의 호언(豪言)도 그리움 투성이다. 시인을 생각할 때마다 시인의 시처럼 가슴 한 켠이 내려앉는 시인에 관한 필자의 기억이다.
시인과 필자는 두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바로 그림과 그리움이다. 글자도 발음도 비슷한 두 단어는 두 작가에게 무한한 환상과 감성적 동기를 부여하였다. '피카소는 열두 살 때 / '나도 라파엘로처럼 그릴 수 있다'고 자랑했다 / 그것이 어린 피카소에게 화필을 넘겨준 이유이기도 하다 / 미술교사인 아버지가 그린 비둘기는 날지 않아도 / 아홉 살 아들이 그린 비둘기는 파닥였으니까 / 피카소는 아흔이 넘어서도 / 젊은 여인의 숨소리에 맞춰 붓을 놀렸다 / 아무나 할 수 있는 손놀림이 아닌데 / 사람들은 함부로 피카소처럼 살고 싶다고 한다' 어쩌면 시인이 아니었으면 화가가 되었을 이생진 시인의 시 '나도 피카소처럼'이다.
'위로가 되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 절망 속에서 희망 잃지 않는 시를 쓰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 설령, 나의 시와 그림이 해결책이 되지 않더라도 / 그저 나의 시와 그림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 잠시 아픈 마음 잊을 수 있다면 / 더 바랄 게 없습니다' 필자의 시 '시인의 다짐'에서처럼 필자 역시 시와 그림은 운명이었다. 그림이 있는 곳에 시가 있었고, 시가 있는 곳에 그림이 있었다. 시는 곧 그림이었으며 그림은 바로 시였다.
'살아서 고독했던 사람 그 사람 빈자리가 차갑다 / 아무리 동백꽃이 불을 피워도 / 살아서 가난했던 사람 그 사람 빈자리가 차갑다 / 나는 떼어 놓을 수 없는 고독과 함께 / 배에서 내리자 마자 방파제에 앉아 술을 마셨다. / 해삼 한 토막에 소주 두 잔 / 이 죽일놈의 고독은 취하지 않고 / 나만 등대 밑에서 코를 골았다' 그리움이 철철 흐르는 이생진 시인의 연작시 '그리운 바다 성산포'의 첫 연이다.
'나는 그를 씁쓸하게 그려 놓았다 / 쓰디 쓴 고초가 백사장에 누워 안간힘으로 파닥거렸으나 / 누구의 미각에도 닿지 못하였으므로 / 아직 수거하고 지나간 이는 없었다 / 나는 그 때문에 속상하였다 / 누웠던 사막에 움푹 들어간 자리는 눈물이 범람하였고 / 해벽을 지나는 강풍을 불러다 말끔히 씻어 낼 즈음 / 한 남자가 배 뒤집고 누운 부시리였음을 알았다 / 나는 그런 그를 박대하였고 / 부재가 의문인 사람들은 / 사내가 바다로 갔다고 수군거렸다' 필자의 시 '바다로 갔다고 수군거렸다'이다.
위 두 편의 시처럼 두 시인에게 평생 시를 쓰게 했던 그리움의 실체는 무엇인가? 또한 두 시인의 고독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바로 그리움의 정체는 제주도였다는 것, 섬 사랑의 종착지는 제주도였으며, 바다 사랑의 근원 역시 제주도였다는 것이다. 이는 한 사내가 불시에 사라져 궁금해할 때 홀로 바다로 떠났다고 수군거렸던 필자에 대한 후담(後談)과 '사람은 절망을 만들고 바다는 절망을 삼키고, 또 사람이 절망을 노래하고 바다가 그 절망을 듣는다'고 말했던 시인과 피할 수 없는 운명 같은 공통점인 것이다.
시인과 필자와의 만남은10년 전 인사동 골목 한 찻집에서 뵙던 게 마지막이었다. '저 섬에서 한 달만 살자 / 저 섬에서 한 달만 / 뜬 눈으로 살자 / 저 섬에서 한 달만 / 그리운 것이 없어질 때까지 / 뜬 눈으로 살자'며 시로써 권유하던 이생진(李生珍) 시인께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
고인의 뜻대로 나는 네 차례에 걸쳐 제주 섬 한 달 살이를 백이십 일이 넘도록 했었다. 하지만 시인의 시심(詩心)과는 별개로 필자의 그리움은 견고하였었다. 아마도 소천하기까지 노(老)시인의 그리움도 그랬을 것이다. 없애려 할수록 더욱 깊게 뿌리내리는, 그 그리움조차 더욱 그리워져 한없이 치를 떠는 역설의 그리움을 안고, 시인이시여 늙어도 늙지 않던 청년 시인이시여, 편히 영면하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