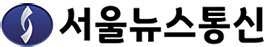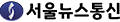동태탕을 먹다 가시가 목에 걸렸다. 순간 이거 아니다 싶어 식당을 박차고 나왔다. 길가에서 손가락을 목구멍에 넣어 토하려고 하니 점점 안으로 들어간다. 손가락을 더 깊숙이 넣어도 소용없다. 몇 번을 시도하였으나 목에 딱 걸리고 말았다. 아파서 침을 삼킬 수 없다.
마침 식사가 끝날 무렵이어서 오늘 식사 모임의 좌장이신 P 고문께서 본인도 그런 적이 있어 가까운 이비인후과서 치료를 받았다며 손수 안내해주셨다. 의사는 길고 끝에 불빛이 달린 금속봉을 목구멍으로 넣을 참이다. 혀를 최대한 내밀라며 혀를 거즈로 싸서 잡아당기며 전방 모니터를 주시하라며, 금속봉을 넣어 요리조리 가시조각을 찾기 시작하였다. 몇 번이고 조금씩 깊이 넣어가며 찾았으나 실패하였다. 더 깊숙이 들어간 것 같아 찾을 수 없다며 소견서를 써 줄테니 큰 병원으로 가라는 것이다. 큰 병원 이래야 수원에서는 빈센트 병원과 아주대 병원을 말한다. 진료의뢰서에 뭐라도 적었는지 보니 병명란에는 'Fish bone' 이란 한 단어가 전부였다. 환자가 아픔을 호소한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다. 우선 급하니 빨리 움직일 수밖에 없다. 비는 부슬부슬 내리는데 뇌출혈과 전림선암 수술까지 받은 빈센트 병원을 먼저 찾았다. 2층 이비인후과에 접수하고 기다리다 호명하여 가니 간호사가 담당의사가 오늘 진료가 없는 날이란다. 아니 어지럼증 진료하신 K 교수를 찾으니 그분은 귀 담당이고 목 담당 J 의사는 오늘 휴진이란다. 하는 수 없이 아주대 병원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물어서 이비인후과에 접수를 시켰더니 목이 아파 침을 삼킬 수 없어 빨리 부탁드린다고 하니 간호사는 태연히 좀 기다리란다. 10분쯤 지났을까 돌아온 답변은 의사선생님께서 수술이 잡혀 있어 진료를 봐 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막막하다. 급하니 의사선생님께 다시 말씀드려 달라고 애원하였으나 수술시간이 임박하여 말씀드릴 수 없다는 답변뿐이다.
이렇게 법석을 피우니 옆에 있던 환자 한 분이 ‘급하시면 동수원 병원으로 가보시지요’, 하며 권한다. 멀지도 않고 가봐야지 하고 차를 돌렸다. 어디든 빨리 가서 가시를 꺼내야지 하는 마음뿐으로 허겁지겁 동수원 병원을 찾았다. 목에 생선 가시 박힌 것쯤이야 쉽게 제거하겠지만 여전히 아프다. 긴 복도를 따라 접수창구에서 번호표를 뽑고 호명해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더니 담당 의사가 퇴근해서 안 계시단다. 할 수 없다. 아직 다섯 시밖에 되지 않았으니 정자동 중심상가 이비인후과를 가는 수밖에 없다. 가고 있는데 식사를 같이한 일행 중 C 선생이 어떻게 됐냐며 전화가 왔다. 몇 군데 병원을 갔었으나 빼지 못하였다 하니 그러면 수원의료원에 가보라 한다. 그렇지 수원의료원을 생각지 못했는데 가는 도중이니까 의료원을 찾았다. 빗줄기가 굵어져 우산을 썼으나 머리와 옷이 젖도록 비를 제법 맞았다. 급히 원무과 접수창구를 찾았으나 여기 역시 담당 의사가 없었다. 이젠 중심상가 이비인후과가 마지막 보루다. 퇴근 시간이 임박해오고 설사 거기도 안된다 해도 죽을병이 아니니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며 마음을 안정시키면서… 그래도 퇴근 전이어서 급히 차를 주차하고 헐레벌떡 이비인후과를 찾았다. 접수순서는 퇴근 무렵이어서 그런지 다행히 세 번째다. 10분만 기다리면 되겠지. 드디어 의사와 마주하였다.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니 일찍 오지 왜 늦게 왔냐는 것이다. 우선 목에 마취를 하고, 처음 병원에서 한 것처럼 끝에 불빛 달린 가느다란 금속 봉으로 찾기 시작했다. 몇 번을 찾더니 너무 깊숙이 들어가 목을 넘어간 것 같아 이비인후과 소관이 아니라 내과로 가란다. 선생님 이 시간에 어떻게 내과로 갑니까 하니 “바로 위층(3층)에 내과가 있습니다” 하며 소견서 가지고 급히 올라가란다. 헐레벌떡 내과를 찾았다. 의사 선생님은 이건 CT나 엑스레이를 찍어 위치를 확인하고 빼내야 하니 지금 할 수 없고, 오늘 저녁과 아침을 굶고 큰 병원으로 가란다. 마지막 기회가 무너지는 순간이다. 어찌할 수가 없다. 참고 견디다 내일 다시 빈센트 병원으로 가야겠다고 마음먹고 집으로 향하였다. 내일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 기진맥진이다.
아내와 밥상을 같이하고 앉았다. 배고파 견딜 수 없다. 의사가 굶으라고 해서 그런지 배가 더 고프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숟가락을 들고 우선 국물부터 한 숟갈 떠서 입에 넣고 삼켰다. 아프다. 또 한 숟갈 먹었더니 역시 아프다. 몇 숟갈 먹으니 차츰 덜 아픈 것 같다. 다음에는 밥을 말아 조금 먹었다. 역시 아프지만 김을 싸서 넘겼다. 밥을 몇 숟갈 먹고 국물을 삼키니 점점 내려가는 것 같다. 그렇게 몇 번 시도하니 걸린 가시가 차츰 목구멍을 지나 위장 쪽으로 내려가는 것 같다. 완전히 위 속으로 내려간 것 같다. 아픈 게 사라져 버렸다. 밥을 먹기 시작했다. 크게 아프진 않았다. 반 공기쯤 먹었을까 식도를 지나 위장 쪽으로 내려간 것 같다. 안 되겠다 싶어 컵에 식초를 한 숟갈 타서 마셨다. 위액만으로는 딱딱한 가시를 녹일 수 없을 것 같아 식초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것이다. 밥 한 공기 다 먹고 식사를 마쳤다. 이젠 통증은 없다. 그러나 그 뻣뻣한 가시가 위벽을 뚫어 출혈이 나면 병원 신세를 지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딱딱한 뼈를 위가 녹일 수 있을까 아니다, 위액이 아무리 독해도 그건 불가능하다. 위에서 소화를 못 시키면 소장과 대장에 상처를 줄 것이다. 분명 출혈이 날 것이고 항문으로 검은 변이 나올 것이다. 이틀을 주의 깊게 관찰하였으나 피가 섞여 나오는 흔적은 찾지 못하였고 변 색깔도 양호한 것 같아 위안이 된다. 며칠이 지났는데도 아직 특별히 아픈 곳은 없다. 어릴 적 어르신들은 목에 가시가 걸리면 쌈을 크게 싸서 삼키라고 하셨다. 그렇게 엉뚱한 처방이 후유증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다. 병원을 돌아다녀도 해결하지 못한 걸 우리 전통 처방으로 해결하다니...
아프면 본인만 섧다. 환자만 급하지 간호사나 의사는 직업상 내 마음 같이 대해주지 못한다. 남의 큰 병도 자기 손가락 피 나는 것보다 못하다는 말이 있다. 안 아프고 병원 안 가는 것이 상책이다.

[약력]
《수원문학》 수필 등단
2024년 백봉문학상 수상
공저 『틈과 여백의 소리』